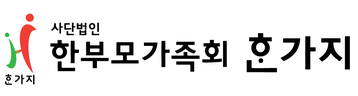필자 하루의 ‘하루수다’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하루의 수다를 푸는 형식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특히 하루는 일본어로 ‘봄’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자 하루와 함께 일상생활의 수다를 풀어볼까 합니다. (편집자의 주)
 |
| 출처=하루 |
봄이 왔다. 입춘을 지나 우수를 건너 경칩도 보냈다. 누가 뭐라해도 봄이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알게 모르게 표정에서 여유가 보인다. 남서풍의 바람이 하늘거리며 콕콕 마음을 찌른다. 해가 잘드는 담벼락 아래에는 온갖 새싹들이 다툼을 한다. 그래, 봄이다.
봄이 오면 여기저기 수줍은 꽃망울이 경쟁하듯 얼굴을 내민다. 가까운 산에 들에 나가보면 어디든 꽃들 천지다. 울긋불긋 산천을 수놓는다. 당연한 소리지만 봄꽃에도 개화 순서가 있다. 자연의 순리대로 정직하게 꽃을 피운다.
동백꽃은 겨울과 봄의 경계선에서 제일 먼저 역할을 수행한다. 매화는 봄의 시작을 처음 알리는 꽃이다. 3월 중순이 되면 생강나무 꽃과 산수유 꽃이 노랗게 봄을 밝힌다. 그 다음 목련화가 하얗게 핀다. 조금 더 있으면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고 복사꽃, 살구꽃,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한다.
이게 모두 다 한 달 안에 이뤄진다. 벚꽃이 지기 시작할 때 싸리꽃과 찔레꽃이 향기를 내며 절정을 이룬다. 봄꽃 중에 향기가 좋기로 알려진 꽃 들이다. 싸리빗자루의 그 ‘싸리’다. 철쭉은 그 뒤에 핀다. 진달래와 철쭉은 그 꽃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
| 출처=하루 |
진달래는 화전의 재료가 되지만 철쭉은 독이 있어 먹으면 안된다. 구별하는 방법은 은근 쉽다. 진달래는 꽃이 먼저 핀 후 잎이 나지만, 철쭉은 잎을 먼저 낸 후 꽃을 피운다. 진달래는 연분홍에 가깝고 철쭉은 진분홍이다. 다양한 개량 꽃들도 철쭉이 대부분이다. 진달래는 연하고 약해 산에 들에 군락을 이뤄 조용히 피지만 철쭉은 관상용으로 도시 곳곳에 보인다. 이제 철쭉까지 피고 나면 여름을 알리는 라일락과 아카시아 꽃이 계절을 대신한다.
이렇듯 봄꽃은 다 제 순서가 있다. 함부로 순서를 어기지 않는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기다린다. 봄 비가 한 번 내리고 나면 너나없이 요란하게 새 꽃을 내지만 잘 관찰해보면 순서를 놓치지 않는다. 봄꽃을 얘기할 때 벚꽃은 빠지지 않는다. 벚꽃은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꽃이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초속 5cm’는 벚꽃의 떨어지는 속도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센티미터. 어느 정도의 속도로 살아가야 너를 만날 수 있을까?”
느린 첫 사랑의 아련함이 벚꽃을 닮았다. 비가 오면 후드득 꽃은 다 진다. 벚꽃도 그렇다. 사흘이면 지고 만다.
생각보다 봄은 짧다. 봄이 지나고서야 봄이었구나 알게 된다. 날씨가 풀려 잠깐 기분이 좋아질 틈도 없이 금방 더워진다. 이상기온 때문에 더 그렇단다. 4월만 돼도 덥다며 반팔 티셔츠를 찾게 된다. 간혹 꽃샘추위가 찾아와 아직 아닌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지만 여튼 봄날은 짧다.
허진호 감독의 영화 ‘봄날은 간다’를 떠올린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아련하고 슬프다. 은수(이영애)의 감정이 이해되고 상우(유지태)의 아픔에 공감하게 된다. 그래서 그랬을까. 내 인생 가장 따뜻했던 봄날에 대한 연민. 추억이라고 말하기에도 참으로 어쭙잖은 기억들. 사랑하고 이별하고 울고 웃고 마냥 떠들고 소리 냈던 아주 오래 된 이야기. 그러다가 결국 ‘사는 건 참 무료하고 지겨워’로 귀결되던 그 때를 다시 떠올리게 된다. 은수를 떠나보내고 아파하는 상우에게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가 조용히 건넨 말이 있다.
“힘들지?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란다”
다시 봄날이 될 때 은수는 상우를 찾아 돌아오지만 상우의 감정은 이미 떨어진 벚꽃이 되었다. 딱 그때의 봄날은 다시 오지 않는다. 정말이지 너무 짧다, 우리네 봄은.
[저작권자ⓒ 해브투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